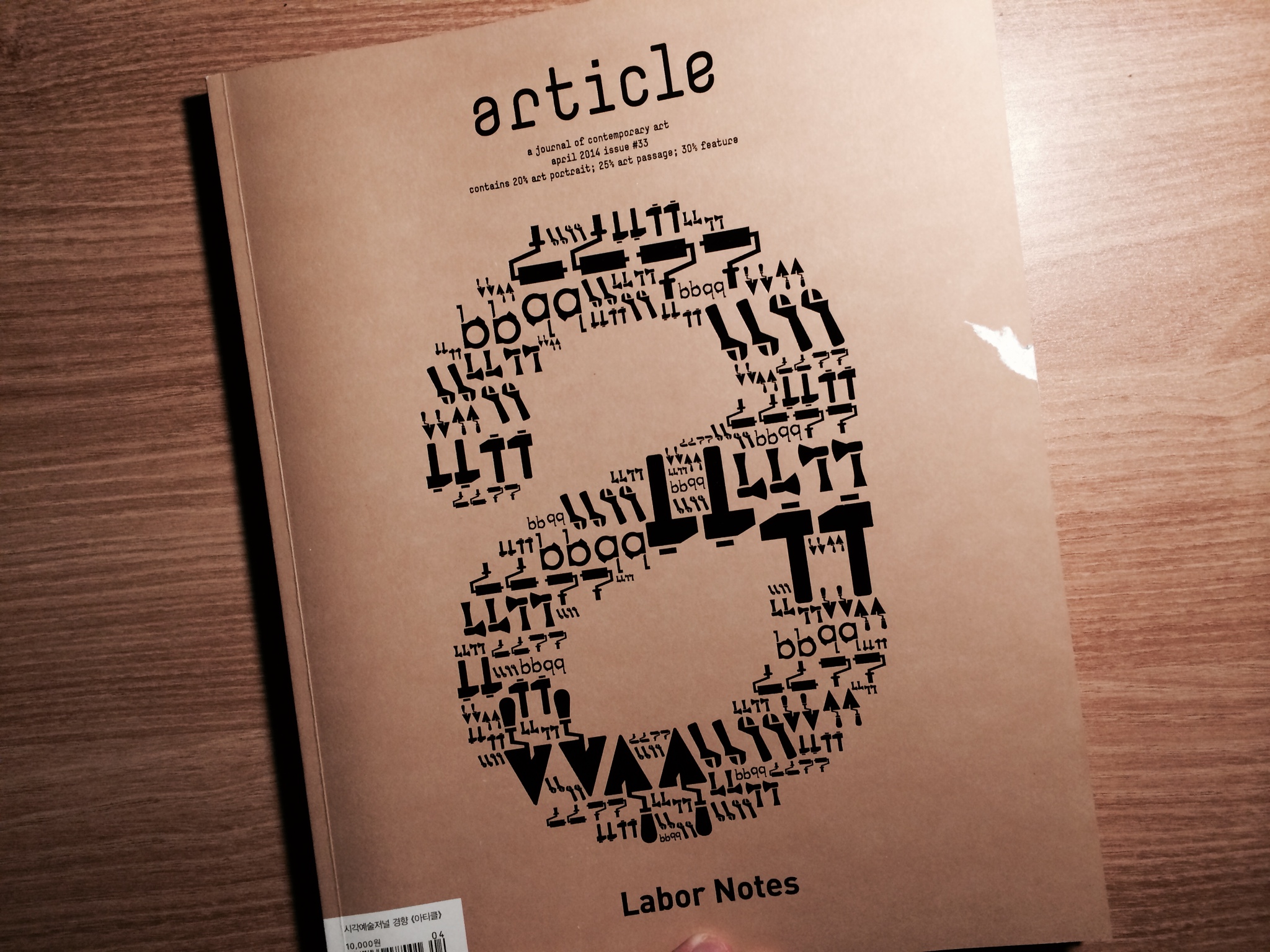
오랜만에 한 예술잡지를 샀다. 가끔 서점에서 들춰보던 예술잡지였는데 이제보니 경향에서 낸 잡지였고, 내용에 호기심이 가서 한번 사 보았다. 그 맨 처음에 편집자의 사설을 읽다 속이 터져버렸다.
이 속터짐은 너무도 다른 비교 때문이다. 평소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법했을텐데, 그 비교 상대는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이다. 하루키이기도 하고 어쩌면 일본 특유의 말투이기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내 느낌일 뿐이고, 내가 수많은 일본 글을 읽고 통계 내 본것이 아니니 확신은 없다.
그 발단은 며칠전에 사 본 하루키의 잡문집이었는데, 그동안의 매체에 기고한 길고 짧은 글들을 모아 ‘잡문집’이라 하여 낸 책이다. 자신의 글을 ‘잡문’이라 하다니 과연 그답다. 하루키의 글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글에서 비슷하게 풍기는 인상이 있다. 가볍다, 날카롭다. 짧지만 핵심을 짚는다. 무거울라 치는 찰라에 슬쩍 발을 빼거나 딴청을 피운다. 자기 조롱에서 문장의 분위기를 가볍게 띄우는가 하면 긴 창을 들고 달려나와 훅 찌르듯 핵심을 파고든다. 일본의 문장은 그런 맛이 있다. 역시나, 하루키의 글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했다면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을텐데, 오늘 읽은 사설이 방점을 찍는다. 이건 일본과 한국의 문장 스타일의 상대성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못썼다. 글을 읽으라고 썼나 싶으며 종국에는 ‘이걸 뭐하러 쓴거야’라는 감상을 남긴다. 예를 들면 이렇다.
‘··· 우리네 예술가들의 현실에서도 그처럼 의결한 삶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도 스친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실상과 견줘 보면 그건 단지 하나의 이상에 머문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선 실현 불가능한, 사고의 범주에서나 이륙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탓이다. (중략)’
‘즉, 작가들이 아무 돈 걱정 없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거나 “전념했으면 좋겠다”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림들이, 그 모든 예술작품들과 예술가들이 문화적 관점에서 인류에게 얼마나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확답은 언제까지든 유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끝)’
이게 말이야 방구야. 요새 이런 글들을 많이 본다. 자신의 속내를 숨기면서 고상한 척하고자 하는 고귀한 영혼들의 말돌리기들, 신문에서-정당 대변인에서-대학의 학생 리포트에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그 제스춰 취하는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터지기가 그지 없는 것이다. 이 지리멸렬하고 맺음없는 단어들을 보고 있자니 자기가 받은 폭탄을 재빨리 옆사람에게 한없이 돌리고 있는 풍경이 떠오른다. 우리 말에는 색과 맛이 다른 재료 들이 많다. 일본 글에서 볼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단어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쓰임은 죄악이다. 차라리 제목만 덩그러니 써서 내용을 상상하게 하는 편이 더 낫겠다. 한페이지 넘겼을 뿐인데 이러면 나머지 장들을 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