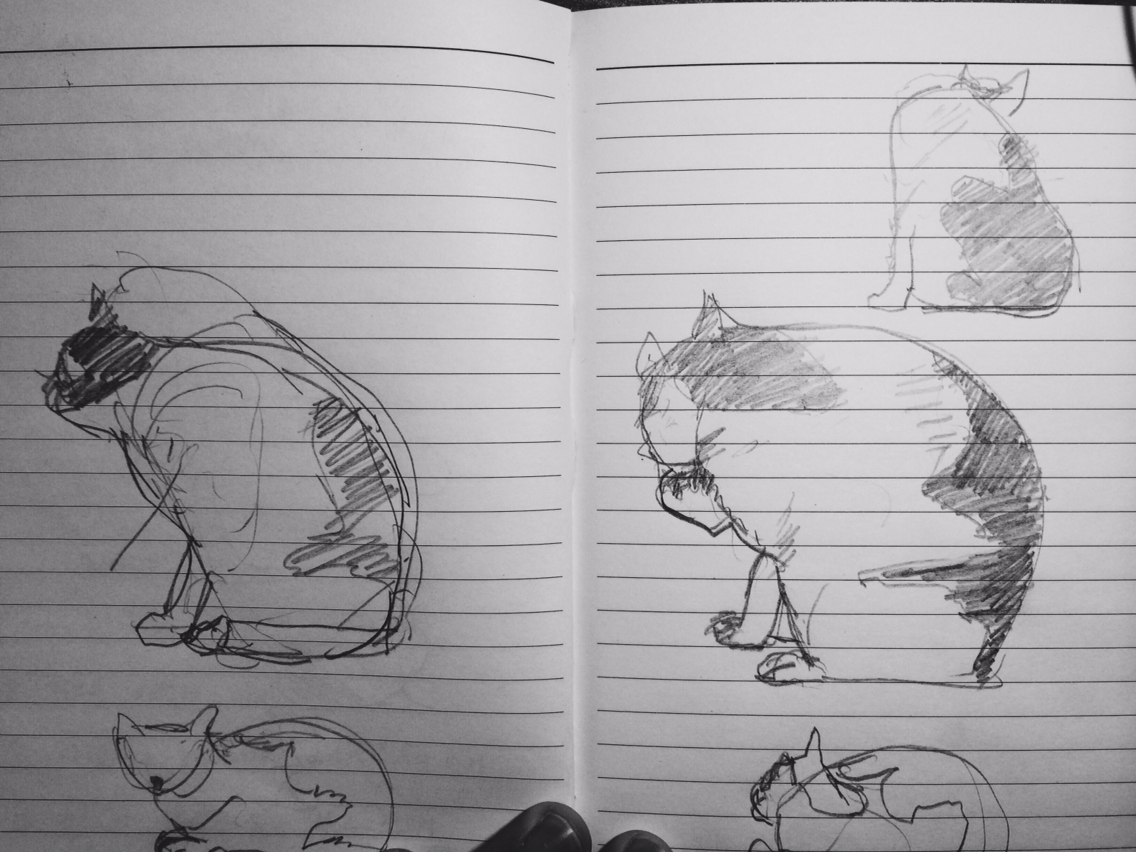본능적으로, 촉각은 단순히 접촉자극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극의 총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명백히, 우리의 뇌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인상들에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구성에 조응하는 불변의 구조를 걸러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윌리엄 깁슨
어떤책에서 밑줄친 건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다. 아마도 매드 사이언스 북이 아니었을라나. 요는 이렇다. 우리는 눈을 감고 손가락만으로 어떤 물건을 만질때 단지 그 느낌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거칠다, 차갑다, 뜨겁다, 미끌거리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런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촉각을 통해 대상을 유추해낸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총체적인 흐름’이 되어 우리가 눈을 감고도 아이의 손인지, 할머니의 손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머리속에서 비교와 추리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번쩍 하고 알게 해 준다.
그렇다. ‘변화하는 감각인상들에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구조를 걸러내는 능력’바로 그것이다. 라고 무릎을 치며 적어놓지 않았으려나.